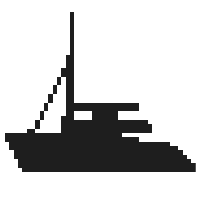「홈스윗홈」, 우수비

“자넨 집이 어딘가?”
직장에서 ‘사는 곳’은 가벼운 대화 주제로 자주 등장한다. 몇 해 전부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사무실 내에서도 들리기 시작하면서 상급자가 직원의 연애에 관해 물어보는 경우는 (여전히 있긴 하지만) 확실히 줄었다. 즐겨 찾던 대화 주제 하나가 금기시되면서 상사들은 직원들이 어느 동네 사는지를 줄기차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물어본 것을 까먹고 또 물어본다. 보통의 대화는 사는 곳의 위치를 묻는 것으로 시작되어 직원이 집 값이 비싼 동네에 살면 “이야 좋은 곳 사네”라며 치켜세워주거나, 본인과 가까운 곳에 살면 대단한 공통점이라도 발견한 듯이 그곳의 랜드마크를 말하며 위치를 재차 확인할 정도로 반가워하며 마무리된다. 그러나 직원이 막 신혼집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대화가 평소보다 좀 길어진다. 무제한 질문 허용권이라도 얻은 것처럼 상사들은 곧 결혼을 앞둔 후배들에게 관심으로 위장된 선 넘는 질문들을 서슴없이 던져댄다.
목요일 퇴근 후 회식 자리였다. 부서 직원들이 다 모이자 모두 첫 잔을 채웠고, 과장님의 건배사가 이어졌다. 마침내 과장님이 “원샷”을 외치자, 모두가 술을 한 번에 탁 털어 마셨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끼리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 옆에 앉아 있던 팀장님은 나에게 결혼 준비는 잘돼가냐며 대화의 물꼬를 텄다. 직장 상사들은 틈만 나면 나의 결혼 준비에 관해 물었다.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은 역시 ‘신혼집은 어디로 했는지’였다. 이번에도 빼먹지 않고 팀장님은 신혼집은 어디로 구했냐고 물었다. 나는 광주 효천지구로 구했다고 답했다. 옆에 있던 남자 선배들은 좋은 먹잇감이라도 찾은 듯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퍼부었다.
Q1: 너도 중흥S클래스냐? (광주 효천지구에는 중흥S클래스리버티, 중흥S클래스에코시티, 중흥S클래스에코파크 등 이름이 중흥S클래스로 시작하는 아파트가 많고 직장동료들도 그곳에 많이 산다.)
A1: 아니요. 저는 돈이 없어서 효천2지구에 구했어요. (앞서 말했던 중흥S클래스를 포함한 고가의 브랜드 아파트는 효천1지구에 모여 있고, 2지구는 주로 서민 아파트가 많다.)
Q2: 어딘데?
A2: 브라운스톤이요.
Q3: 몇 평?
A3: 30평이요. (정확히 말하면 29평인데,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했다.)
Q4: 사서 들어갔어?
A4: 네. 대출받았어요.
Q5: 대출도 능력이지. 집값이 얼만데?
A5: 2억 7천이요.
Q6: 그렇게 싸? 몇 년 준공인데?
A6: 2018년인가 그래요.
Q7: 누구 명의로 했어?
A7: 공동명의로 했어요.
잘했네. (뭘 잘했다는 건지.)
집의 위치, 면적, 집값 등.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압박 질문을 하나하나 대답하고 있자니 나에 대해 낱낱이 평가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스멀스멀 더러워졌다. 나는 괜히 브라운스톤이라는 아파트 이름조차도 대답하기가 꺼려졌다. 이름이 S클래스는커녕 골드, 실버도 아닌, 그냥 돌이라니. 마치 "저의 클래스가 스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1차 회식을 마치고 돌멩이가 된 기분으로 데굴데굴 식당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탔다. 시장의 시옷도, 경제의 기역도 모르는 나는 답답한 마음에 허황한 상상을 해본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는 집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동 거리만큼 값이 매겨지는 기차 승차권처럼 집값도 단순히 주택 면적만으로 정해지면 좀 더 공평해지려나? 아니야. 그럼, 사람들은 아파트 평수로 비교하겠지? 그럼, 1인 가구는 17평, 2인 가구는 25평, 3 ~ 4인 가구는 34평에서만 살 수 있게 한다면? 이건 또 너무 강제적인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답을 알았으면 애덤 스미스요, 마르크스겠지.
뜬구름을 잡다 보니 어느새 택시는 효천2지구 브라운스톤아파트 입구에 멈췄다. 택시에서 내리자, 입구 옆에 있는 브라운스톤공인중개사가 보였다. 그곳에서 집의 잔금 치르던 날이 생각났다. 타인들은 안줏거리 삼아 너무도 쉽게 재단해 버린 우리집을 샀던 날. 형렬과 나, 집주인 그리고 법무사. 네 명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모였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네 명 모두 긴장한 채 목각인형처럼 뚝딱거렸다. 형렬과 나는 아무리 은행 돈이라고 해도 억 단위가 넘는 거금을 써본 적은 처음이라 잔뜩 신경이 곤두서있었다. 중년의 여성이었던 집주인도 주택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지 굳은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앳된 얼굴의 법무사. 분명 은행 직원이 건넸던 법무사의 명함에는 나이가 지긋한 중년 남성의 사진이 있었는데, 우리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갓 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보이는 청년이었다. 아마 우리가 소개받은 법무사의 법률사무소 신입인 듯했다. 법무사는 새 옷처럼 보이는 빳빳한 흰 셔츠를 입은 채, 캐릭터 필통에서 볼펜을 꺼냈다. 그는 대학생이 수학 과외를 해주듯 어설프지만 진지하게 거래할 집의 가격, 주택담보대출금, 집값에서 대출금을 빼고 우리가 입금해야 할 나머지 금액을 종이에 꾹꾹 눌러 적어 가며 설명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혹여나 놓칠세라 유심히 들었다. 모두가 서툴러 보였으나 허투루 앉아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됐다.
형렬이 먼저 집주인에게 잔금의 일부를 이체했다. “띠링” 바로 집주인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다음은 은행에서 나머지 잔금을 이체했다. “띠링” 알림음이 또 한 번 울렸다. 이렇게 집주인과 우리 사이의 주택 거래 절차는 끝이 났다. 집주인은 어색한 듯 웃으며 전자키 뭉치들을 나에게 건넸다. 두 손이 묵직해질 만큼 많았다. 아파트 공동 현관 전자키 2개, 우리가 살 집의 도어락키 4개, 음식물쓰레기 개별 종량제 카드 1개. 법무사가 이 자리를 마무리하려 하자, 집주인은 옆에 내려뒀던 큼직한 무언갈 우리에게 건넸다. 잘풀리는집 두루마리 화장지였다.
“집을 팔려니, 좀 시원섭섭하네요. 그래도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기분이 좋네. 앞으로 예쁘게 살아요.”
나는 그날 한 시간도 채 보지 않은, 단지 거래 관계로 만난 중년 여성에게 받게 된 뜻밖의 호의를 들고 한참을 만지작거렸었다.
나는 아파트 앞 공동현관을 지나 우리 집으로 올라갔다.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러 도어락을 열었다. “삐리릭” 전자음과 함께 대문이 닫혔다. 집안은 왁자지껄한 바깥세상과 달리 딴 세상처럼 고요했다. 문 안쪽에는 나와 형렬이 함께 찍은 네컷 사진들이 옹기종기 붙어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디퓨저 향이 났다. 우리 집에 도착했음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사이즈가 290mm인 형렬의 기다란 신발 옆에 신발을 벗어두고 중문을 열었다. 형렬이 소파에 누워 코를 골고 자고 있었다. 흡사 알래스카 곰이 누워있는 것 같았다. 널빤지만 한 발바닥을 내놓고 벌러덩 자는 모습이 귀여워서 킥킥 웃음이 나왔다. 나는 자고 있는 형렬을 나무 안듯이 품 안 가득 껴안았다. 몸통이 커다래서 양팔에 겨우 담겼다. 든든하고 편안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그 순간 여기가 어디든, 어떻든, 아무렴 좋았다.
「홈스윗홈」
- 발행일 2025년 10월 7일
- 글쓴이 우수비
- 작은배가 진행하는 <일상묘사 : 수필 합평 모임>에서 탄생한 글입니다.
- Zine으로 만들어 읽기
PDF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한 후 8페이지 Zine 만드는 법에 따라 자르고 접으면, 글이 담긴 Zine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또 하고 싶은 산책」, 곽은비
· 「까만 밤 하얀 밤」, 고은비
· 「김밥 한 줄」, 왈
· 「홈스윗홈」, 우수비
· 「사랑과 방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호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