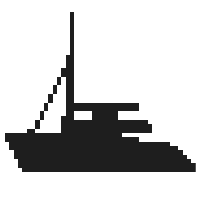「또 하고 싶은 산책」, 곽은비

간만에 기분 좋은 산책을 했다. 늦여름 밤 제주 서문시장과 그 동네에서 말이다. 열 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과 같이 시장 골목과 동네 구석구석을 누볐다. 차분하고 한산한 시장 한복판을 걷는 게 새로웠다. 우리는 시장 상인이나 이 동네 주민이 아니면 모를 것 같은 시장 뒷골목에 들어가기도 하고, 서문시장 건물 안에 있는 복도를 쏘다니기도 했다. 물에 젖은 오래된 시멘트 바닥과 시장 고깃집에서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얘기를 나누는 모습은 연극이 끝나고 나서 무대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지하 주차장에서는 다 같이 눈을 감고 걸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앞 사람 어깨에 한 손을 얹고 서로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보이는 건 없지만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빛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같았다. 발에는 하수구 구멍을 지나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감고 걸으면서 주차장에서 울리는 목소리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동시에 듣고 있으니 신비로운 곳에 온 것 같았다. 시장을 나와서는 동네 골목길을 거닐었다. 깜깜한 골목에는 자동 센서가 있어서 우리와 가까워질 때마다 자동으로 불이 켜졌다. 내 앞으로 불빛이 켜지면서 골목이 밝아지니까 왠지 이벤트를 받는 기분이었다. 산책 막바지에는 아스팔트 도로보다 낮은 집으로 몸을 숙여 들어갔다. 그 집에는 기타를 퉁기며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시원한 요구르트를 한 병씩 까며 그 예술가의 기타 연주와 노래를 들었다.
이 산책은 관객과 예술가가 함께 탐험하는 거리 이동형 공연인 <사변소설>의 한 부분이었다. 우리가 산책한 길거리는 공연을 위해 꾸며진 곳이 아니었다. 그저 사람들이 지내는 그곳 그대로였다.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 게 많았다. 내 동네는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동네 산책을 하니 마음이 가득 차는 느낌이 좋았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나는 매일매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이었던 산책을 했다. 우리 집 강아지와 했던 산책이다. 강아지가 비 맞는 걸 싫어해서 비 오는 날 빼고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밖으로 나가 바깥 공기를 쐬었다.
우리 강아지 이름은 초롱이다. 곽초롱. 우리 아빠는 곽 씨이고 나도 곽 씨이다. 그러니 우리 집 막내인 초롱이도 자연스레 곽 씨가 되었다. 나랑 초롱이는 2009년 가을에 처음 만났다. 초롱이는 몰티즈였다. 갓 목욕하면 하얀 강아지였지만 며칠 지나면 조금 누레졌다. 털을 짧게 깎으면 분홍색이 됐다. 그래도 눈동자랑 코는 항상 까맸는데, 열세 살쯤부터는 왼쪽 눈이 하얗게 변했다.
초롱이는 늠름하고 위풍당당한 강아지였다. 네발을 땅에 딛고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이 참 멋졌다. 자신도 멋있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걸을 때는 항상 자신 있게 도도도도 걸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고 바로 표현하는 것도 초롱이의 멋진 점 중 하나였다. 가고 싶은 길이 있으면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갔고 걷기 싫어지면 집 쪽으로 돌아가거나 길바닥에 털썩 앉아버렸다. 똥이든 방구든 트름이든 자기 몸에서 내보내고 싶으면 언제든 내보냈고, 언제 어디서 어떤 것이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멩!” 짖어서 표현했다. ‘쪼롱’, ‘롱’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거나 어떤 음정이나 박자를 넣어 불러도 다 알아듣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가끔 내 몸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핥아주고, 밤에는 우리 가족이 잘 자고 있나 방마다 들어가서 확인했다. 길을 가다 모르는 고양이를 만나면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대치했다. 고양이와 초롱이의 긴장감 넘치는 기싸움이 벌어지면 나까지 숨을 죽이게 될 정도였다. 걸어 다니는 비둘기나 꿩을 만나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와다다 달려가서 새들을 쫓아내고 그 구역을 자기가 노닐었다. 내 종아리보다 조금 큰 크기의 생명체라서 귀엽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완전히 인간의 관점이다. 강아지 세계에서 본다면 초롱이는 분명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진 당당하고 멋있는 강아지일 테다.
나는 이렇게 멋진 강아지와 함께 매일 산책을 했다. 초롱이는 이미 자기 동네를 꿰뚫고 있어서 초롱이가 나를 산책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 나는 호위무사처럼 초롱이를 쫓아다니면서 가면 안 되는 곳에 가거나 차가 지나다닐 때 안전하게 막아주는 역할이었다. 그리고 초롱이가 싼 똥도 치웠다. 그건 인간의 숙명이다. 초롱이는 산책 나가면 꼭 이리저리 냄새를 맡고 오줌을 쌌다. 초롱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똥냄새, 아마도 다른 개가 싼 오줌 냄새,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 냄새, 실 멸치 같은 개미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데 냄새, 풀 냄새, 흙냄새를 많이 맡았다. 풀 냄새와 흙냄새는 보도블록 틈이나 길가 옆에 있는 조그마한데 말고 우거지고 깊숙한 곳에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서 맡는 걸 좋아했다. 무성하게 자란 덤불이나 잔디밭 흙밭 같은데 말이다.
하루는 너무 궁금해졌다. 도대체 무슨 냄새가 나길래 저렇게 코를 박고 열심히 냄새를 맡을까? 그래서 초롱이가 냄새 맡았던 데를 나도 한 번 맡아봤다. 몸을 쭈그리고 땅 냄새를 맡았다. 시멘트길 구석탱이에선 별 특별한 냄새는 안 났다. 그냥 시멘트 바닥 냄새였다. 흙밭에서는 그냥 흙밭 냄새가 났고, 풀에서는 풀 냄새가 났다. 내가 대충 알고 있는 냄새였지만 직접 코를 대고 맡아보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생생한 냄새였다. 초롱이는 여기에서 어떤 재미있는 냄새를 맡았을까? 초롱이가 좋아하는 향기 취향은 자세히 모르지만 나보다 후각이 훨씬 뛰어나니까 더 다채로운 향을 맡았겠지. 초롱이는 또 유유히 걸어갔다. 그리고 다른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오줌을 찍 남겼다. 다 싸서 이제 나올 쉬도 없을텐데 오줌을 몇 방울이라도 짜냈다.
초롱이는 나이가 들수록 주로 집 근처만 돌아다녔고 집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 비가 오면 절대로 바깥에 나가지 않았지만, 햇빛이 비치면 꼭 산책을 즐겼다. 초롱이는 그늘보다 햇볕에 앉아 있는 걸 좋아했다. 눈이 부셔서 눈을 가늘게 뜨고 있어도 해가 드는 곳으로 가서 엎드려 쉬었다. 그러면 나도 초롱이를 따라 길바닥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햇빛 받고 바람 맞고 그랬다. 초롱이는 자기 성에 찰 때까지 한참을 앉아 있어서 나는 그림자 진 곳에 들어가 앉아 있기도 했다. 나랑 초롱이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누구든 먼저 일어나면 그 누구를 따라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내가 언제 무릎을 땅에 대고 길바닥 냄새를 맡아보고, 강아지를 따라 길에 앉아서 신선처럼 있어 볼까. 초롱이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산책을 못 해봤을 거다.
초롱이랑 자주 산책했던 델 가면 초롱이가 어떻게 돌아다닐지 뻔히 보인다. 여기서 오줌싸고, 저기 가서 또 오줌싸고, 풀숲에 들어가서 냄새 킁킁 맡다가, 슬금슬금 자리를 잡고 몸을 동그랗게 움츠려서 똥 싸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자기 갈 길을 가다가 여기저기 냄새를 맡고, 갑자기 귀때기를 날리면서 뛰다가, 우아하게 어슬렁거리다가, 저만치 달려가다가 멈춰서서 뒤돌아보고. 나는 정말 이런 산책을 또 하고 싶다.
「또 하고 싶은 산책」
- 발행일 2025년 10월 7일
- 글쓴이 곽은비
- 작은배가 진행하는 <일상묘사 : 수필 합평 모임>에서 탄생한 글입니다.
- Zine으로 만들어 읽기
PDF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한 후 8페이지 Zine 만드는 법에 따라 자르고 접으면, 글이 담긴 Zine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또 하고 싶은 산책」, 곽은비
· 「까만 밤 하얀 밤」, 고은비
· 「김밥 한 줄」, 왈
· 「홈스윗홈」, 우수비
· 「사랑과 방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호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