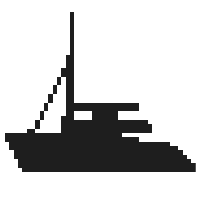「김밥 한 줄」, 왈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독립이라면, 나의 독립은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첫돌을 맞이할 즈음, 우리 아빠는 엄마에게 세 명의 아이와 2억 원의 빚만 남겨놓은 채 위암으로 죽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사채업자를 피해 캐나다로 도망치듯 떠났다. 그곳에서 홀로 우리 세 남매를 키우며 아빠가 남긴 빚을 갚아야 했던 엄마는 토론토에 있는 한식당의 웨이트리스 일로도 모자라 시간제 아르바이트 몇 가지를 더 했다. 엄마는 생계에 치여 좀처럼 집에 들어 오질 못했다.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던 언니와 오빠 또한 학업과 아르바이트, 또는 친구들을 만나 노느라 늦둥이 막냇동생을 돌봐줄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4살 무렵부터 혼자 집에 남겨져 있던 날이 많았다.
그런 나에게 집 안에서 유일한 친구가 되어줬던 것은 텔레비전이었다. 외국 땅, 외국 사람, 외국 문화, 그리고 텔레비전마저 외국산인 화면 안에서 도통 무슨 말들을 떠드는 건지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적막한 집 안에 시끌벅적한 사람 말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만으로 나에겐 작은 위안이 되었다.
식구들 모두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던 어느 날, 나의 친구 텔레비전은 야심한 시간대에 걸맞은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내가 보고 있던 영화 채널에서는 당시 최고의 공포 영화인, 기괴한 해골 가면을 쓴 살인마가 나오는 ‘스크림’이 방영되고 있었다. 나는 무서웠지만 채널을 돌리지 않고 화면을 주시했다. 그렇게 거실에서 “헬로우, 시드니”라는 살인마의 음성과 대치하던 나는 갑자기 거실을 제외한 3개의 방에 차례대로 불을 켜고서 각 각의 방문을 모두 닫고 열쇠로 잠가버렸다. 그러고선 거실 소파에 누워 이불로 온몸을 감싼 뒤 얼굴만 꺼내 놓고 스크림을 시청하며 벌벌 떨었다. 가족들이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말이다. 그 시절 나는 왜 그랬을까. 그러고 있으면 우리 가족이 '짜잔'하고 나타나서 나를 구해줄 줄 알았던 걸까? 결국 가족은 내가 스크림을 보다 잠든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나는 홀로 버티는 법을 조금씩 익혀가고 있었다.
혼자 집에 있는 것이 유독 싫게 느껴지는 날도 분명 있었다. 하루는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외출하는 오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나가지 말라고 떼를 썼었다.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오빠는 나를 마구잡이로 때리고 이 손 놓으라며 나를 떼어놓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세상 무너지듯이 앙앙 울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확실한 건 그때의 경험이 내게 꽤 충격적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든 의지를 하면 할수록 버림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진 걸 보니 말이다. 성인이 되어서야 오빠에게 그 시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오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내가 처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언니는 캐나다에 머물며 남은 유학 생활을 계속했고, 오빠는 독립을 해 따로 살았기 때문에 10평도 채 안 되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엄마와 나, 단둘이 살게 되었다. 엄마는 형편상 여전히 일을 놓을 수 없었고, 나는 여전히 혼자 남아있는 법을 배워야 했다. 하지만 외로움을 견디는 법만큼은 배우지 못했다. 엄마가 회사에 가서 조금이라도 늦는다 싶으면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 “저 최서정 딸인데요. 우리 엄마 언제 와요?”하고 다짜고짜 묻곤 했다. 엄마가 늦는 와중에 회사까지 문을 닫아 엉뚱한 전화도 못 걸게 되면 창밖의 아파트 단지 정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년 전체가 소풍에 가는 날이었다. 나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싸 들고 소풍에 가는 것을 내심 기대했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떠 보니 테이블에는 만 원짜리 두 장과 ‘김밥은 사 먹어, 미안해.’라고 적힌 쪽지만 남겨져 있었다. 소풍에 가기 싫어졌다. 엄마가 싸준 김밥이 아닌 분식집에서 사 온 김밥인 게 티 날 까봐. 그렇게 나는 소풍에 가려고 입은 옷 그대로 방 한편에 앉아 멀거니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었다. 집 전화기가 두어 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엄마가 벌써 돌아왔나? 소풍 안 갔는데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간다고 해야 하나?’ 설렘과 불안감을 안고 문을 연 순간, 아랫집에 사는 같은 학교 친구의 엄마가 웬 도시락통을 들고 서 있었다. 내가 소풍에 가지 않은 사정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그 아줌마는 자기 아들에게 싸주고 남은 김밥을 챙겨주며 끼니 거르지 말라고 나를 다독였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은 기분을 참아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배꼽인사를 했다. 문이 닫히고 그 자리에 덩그러니 선 채 생각했다. 문 앞에 있던 사람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아 도시락통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정갈하게 담겨있는 김밥 하나를 집어 입에 넣고 우걱우걱 씹었다.
단무지를 씹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김밥 한 줄」
- 발행일 2025년 10월 7일
- 글쓴이 왈
- 작은배가 진행하는 <일상묘사 : 수필 합평 모임>에서 탄생한 글입니다.
- Zine으로 만들어 읽기
PDF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한 후 8페이지 Zine 만드는 법에 따라 자르고 접으면, 글이 담긴 Zine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또 하고 싶은 산책」, 곽은비
· 「까만 밤 하얀 밤」, 고은비
· 「김밥 한 줄」, 왈
· 「홈스윗홈」, 우수비
· 「사랑과 방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호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