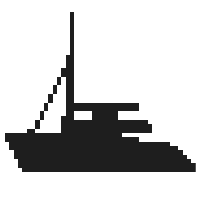「글 쓰기 싫어서 쓰는 글」, 윤재

나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편의 인간이다. 내게 ‘하고 싶은 일’이란 노력 대비 수월하게 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살짝 찍어 먹어보고 ‘오 나 좀 치는 듯 ㅋㅋ’ 싶으면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버린다. 그래서 늘 새로운 일을 대할 때 처음엔 나대다가, 조금이라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포기했다.
스키를 처음 배웠을 때도 그랬다. 남들보다 빨리 익히는 것 같아서, 겁도 없이 중급자 코스에 곧바로 올라갔다. 거의 일자로 내려온 탓에 속도 조절을 못 하고 몇 바퀴를 굴렀다. 산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쳐둔 그물망에 멈춰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울면서 “나 안 탈래...”하고 혼자 방에 들어갔다. 그 뒤로 스키는 다시 타지 않았다.
못할거 같다고 생각이 드는 일은 시도도 안 하고, 잘한다고 착각했다 싶으면 또 바로 접는다.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도 자신감이 떨어져도 계속하게 된 일이 있다. 글을 쓰는 일이다.
시작은 이사님의 한마디였다.
“매디가 쓴 문서에는 감정이 없어.”
순간 머릿속에 물음표가 잔뜩 떴다. 업무 문서에 감정? 어떻게? 수필도 시도 아닌데 왜 감정이 담겨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묘하게 납득이 되는 말이었다. 내 업무 문서들은 AI와 함께 내 생각을 발전시키고, AI가 정리해 준 글이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AI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건 아닐까 고민하던 찰나여서, 더 그 말이 머릿속에 박힌 것 같다. 그래서 난 인공지능 녀석의 의견이 한 톨도 섞이지 않은 글을 써보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을 하고 며칠 뒤, 우연히 수필 합평 모임을 발견했다. 모임에 대해 안내하는 글에는 신청 버튼을 곧바로 누르게 만든 문장이 있었다.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풍경에서 한 발짝 멀어집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글을 써보면 어떨까요?’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글쓰기가,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주는 문장이었다. 그 문장 한 줄 덕에 나는 삶을 관찰하고 기억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원래도 떠드는 걸 좋아하는 수다쟁이라, 2,000자 내외의 수필을 쓰는 일이 처음엔 쉬웠다. 그냥 내가 조잘거리던 ‘썰’을 글로 옮기는 것 정도라고 생각했다. 주제만 딱 정하면 숨도 안 쉬고 술술 써 내려갔다.
글을 쓰기 시작하고 가장 먼저 변한 건 ‘생각의 주도권’이었다. 일을 하다가 고민이 생기면, 바로 지피티 선생님을 찾기보다는 메모장을 열고 고민거리를 적기 시작했다. 그리고 AI는 그 고민거리를 좀 더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사용했다. 업무 문서에서도 인공지능이 나열해 준 번지르르한 단어들 대신, 내 생각이 날 것 그대로 적히기 시작했다. 그제야 이사님이 말한 ‘문서에도 감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예상하지 못한 변화도 있었다. 일상을 기록하는 일이 6년 간 치료 중이던 조울증에도 영향을 주었다. 지난 진료에서 원장님이 말했다.
“윤재님, 글 계속 쓰세요. 감정을 정제하는 힘이 생긴 덕분에 단약을 더 앞당길 수 있겠어요.”
그날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렇게 내 삶에 활력을 주던 글쓰기가, 이상하게도 열 편쯤 쓰고 나니 재미가 없어졌다. 합평에서 들은 말들이 자꾸 떠올랐다. 독자를 생각하며 문장을 다듬기, 정보 충분히 주기, 논리 점검하기, 비문 고치기 등등. 이런 것들이 내게는 하기 싫은 일처럼 느껴졌다. 즉, 그것들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일이다.
스키 중급자 코스에서 그물망으로 굴러떨어진 그때처럼, 글도 조금 써보고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붙었다가 어딘가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합평 동료들이 칭찬해 준 '탁월한 글감'과 '재밌는 제목'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지점에 와있었다.
평소라면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어쩌라고.’ 하고 바로 돌아섰을 텐데, 이번엔 그 말들이 무시가 되지 않았다. 그건 더 이상 ‘썰 풀기’가 아니라, 진짜 글쓰기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 글을 쓰며 돌아보니 글이 나를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생각의 주도권을 되찾게 했고, 일상을 더 유심히 들여다보게 했고, 조울증 치료에도 영향을 줄 만큼 감정을 돌보는 힘도 길러줬다.
그 변화들 외에도 내가 글 쓰기를 계속 해내고 싶은 큰 동력이 생겼던 날이 있다. 내 글이 인터넷 어딘가에 올라와 있는 글이 아닌, 실체가 있었던 순간이었다.
수필 모임장이 ‘책처럼 보이게’ 디자인해 준 작은 소책자. 나는 그 디자인 파일을 출력해 자르고, 접고, 풀로 붙였다. 그리고 그럴싸해 보이기 위해, 어울리는 마스킹 테이프를 골라 제본하듯이 정성스럽게 붙였다. 까슬거리는 커터 칼의 자국과 풀칠 때문에 울렁이는 종이. 그걸 작가로서의 첫 명함이라고 생각하고, 군산 북페어에 20부 정도 챙겨갔다.
그런데 그 허술함을 누군가가 ‘책’으로 대했다. 군산 북페어에서 만난 한 작가님이 내가 만든 작은 책자를 두 손으로 받더니 “직접 만드신 거예요?”하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얼마를 드리면 되냐고도 했다. 나는 당황해서 “아뇨… 그냥 드리고 싶어서, 만들어 왔어요.”라고 했다. 그러자 그 작가는 손사래를 치며, “그냥 받을 수 없죠"하고 책 값 대신 자신의 책 한 권을 건넸다.
커터 칼 자국이 그대로 보이던 작은 종이를 책처럼 대하던 표정이 자꾸 떠오른다. 누구도 나에게 계속 쓰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 내 글이 처음으로 ‘손에 잡히는 형태’를 갖춘 순간이었다. 그래서 이번엔 도망칠 수 없다.
「글 쓰기 싫어서 쓰는 글」
- 발행일 2025년 12월 17일
- 글쓴이 윤재
- 작은배가 진행하는 <일상묘사 : 수필 합평 모임>에서 탄생한 글입니다.
- Zine으로 만들어 읽기
PDF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한 후 8페이지 Zine 만드는 법에 따라 자르고 접으면, 글이 담긴 Zine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미련없이 후회없이」, 고구말랭이
· 「임신이라는 사건」, 고은비
· 「미션! 조르바 100」, 왈
· 「스프링뱅크를 찾아서」, 우수비
· 「글 쓰기 싫어서 쓰는 글」, 윤재
· 「가게 밖의 사람들」, 호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