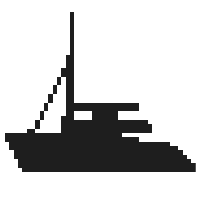「여름의 맛」, 무지

‘와 그늘도 더운 날이네.’ 운동장에 서 있던 나는 무심결에 스탠드 아래로 한 발짝 더 들어갔다. 아이들은 연신 덥다, 더워를 외치면서도 피구장만이 자신들의 공간인 양 자리를 잡았다. 잔뜩 벌게진 얼굴들을 유심히 보며 호루라기를 꾹 꾹 눌렀다. 저 멀리 굴러가는 공에 또 죽어라 달려간다. 그리고 공을 잡은 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곤 이빨을 보이며 씩 웃는다. 옆에서 같이 그 공을 쫓던 아이도 뭐가 그리 좋은지 웃고 있다. 어느덧 양 팀 모두 2명씩 남았다. 핸드폰 화면을 켜 시간을 확인했다. 이쯤에서 멈추는 게 좋겠다는 감이 든 순간, 호루라기를 삐-삑- 누른다. 곧장 아이들이 묻는다. “한 판만 더 하면 안 돼요? 제발요.” “응 안 돼.” 손을 씻고 급식실로 가는 길, 와글와글 시끌시끌한 틈으로 완전 재밌었다고 하는 말이 내 귀에 콕 들어왔다.
7월이 되자 어김없이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덥지 않은 여름을 내심 반가워했는데 다음 주부턴 폭염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다. 아이들을 보내고 뒤늦게 확인한 메신저에도 온열질환 대비에 철저히 해달라는 교감 선생님의 당부가 적혀있었다. 피구하러 나갔던 나의 모습이 괜히 찔려 오늘 날씨도 다시 검색했다. ‘휴,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었다.’ 그 김에 일몰 시각도 한 번 더 확인했다. 머릿속에 조퇴해서 카페 갔다 노을 보는 완벽한 일정이 착착 정리됐다. 찝찝함은 뒤로 하고 서둘러 교실을 정리했다.
교문을 나서 파란 하늘을 보고 있자니 눈이 부셨다. 잠시 잊고 있던 습함과 뜨거움이 훅하고 들어왔고 금세 머리카락과 콧등, 겨드랑이가 찐득해졌다. 다행히 버스를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문이 열리는 순간, 여름 최고 피서지는 버스라는 것을 되새기며 나는 기사님 뒷자리에 앉았다. 이 시간에 학교 밖을 나온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졌는지 습관처럼 핸드폰에 손이 가는 걸 급히 멈추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다. 창문 밖으로 낮게 펼쳐진 바다가 보였다. 에메랄드빛 바다였다. 저 멀리 육지가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날이 맑은 걸 보니 새빨간 노을은 못 보겠다는 미련은 제쳐두고 15초 정도 멍하니, 휙휙 지나가는 건물들 속 쨍쨍하게 피어오른 구름을 바라봤다. 여름이 왔구나 싶었다.
버스에서 내리니 후덥지근한 공기가 다시금 몸을 감쌌다. 아직 햇살이 따가웠다. 발걸음을 재촉해 도착한 카페는 생각보다 더웠다. 어라? 사장님이 방금 환기한 탓인지, 내 몸이 달궈져 있던 탓인지 미지근한 온도가 낯설었다. 왠지 기운이 빠졌지만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며 마음을 다독였다. 메뉴판을 쭉 훑어본다. 사실 주문할 메뉴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래, 오늘은 아무래도 너인 것 같아.’ 미리 알아보고 온 메뉴 이름을 내 눈으로 보자 더욱 반가운 기분이 들었다. “여름다운 핸드드립 아이스로 한 잔 주세요.”
여름에는 특히나 수박, 초당 옥수수가 들어간 디저트처럼 여름 시즌 메뉴에 눈길이 가는 것 같다. 나도 좋아하는 원두를 마다하고 ‘여름’이 들어간 새로운 맛을 선택해 버렸다. 체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가. 모든 식물이 가장 싱그러워지는 계절이라 그럴까. 내가 시킨 커피는 복숭아 아이스티 같은 새큼한 매력이 있는 커피였다. 어느덧 몸도 마음도 시원해졌다.
일몰 시각보다 조금 일찍 카페를 나와 근처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물놀이를 신나게 즐기는 사람들 사이 검정 드레스를 입고 웨딩 촬영을 하는 커플들도 보였다. 여전히 뜨거운 햇빛에도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다. 물이 이렇게 맑았었나? 당장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벤치를 찾아 앉았다. 조금 있으면 노을이 질 것 같았다. 막간에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전요원 배치 시간과 안전 수칙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흘러나왔다.
앞을 보지 않아도 붉은 기운이 느껴진다. 시선이 딱 멈춘 곳에서 수평선을 따라 고개가 천천히 움직인다. 출렁이는 물결부터 층층이 쌓인 구름 사이사이까지 온 세상이 주홍빛이다.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작은 등대와 인간만이 까말 뿐이었다. 얼굴 곳곳에도 검은 모래를 묻힌 아이가 꺄르르 웃으며 뛰어다녔다. 이토록 강렬하면서도 낭만적인 노을이라니.
이런 장면을 기대했다. 며칠 전, 컴컴하고 시원한 영화관에 있느라 이런 장관을 놓친 게 아쉬웠던 터였다. SNS로만 봤던 그런 새빨간 노을은 아니었지만 은은한 빛이 펼쳐지는 오늘의 여름 노을이었다. 깨끗한 하늘 위 환한 태양이 서서히 물들었고 하얀 초승달과 밤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퍽 어울렸다. 한동안 앞을 바라보다 왜 땡볕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뛰놀던 아이들이 다시 떠올랐는지는 모르겠다. 여느 때보다 무더운 여름을 자연스럽게, 마음껏 즐기는 모습이어서 그랬나.
‘이래야 여름이지’ 하고 가벼운 새 옷과 양산을 꺼내고, 맛있는 제철 음식을 먹으러 가고, 동네 담벼락 능소화를 매일 관찰해야겠다. 에어컨을 켠 방에서 이불 덮고 낮잠을 자고, 밀린 집안일은 좀 더 미뤄두고 추리 소설을 몰아보겠노라 하는 더할 나위 없는 계획도 술술 떠올랐다. 너무 더우면 그냥 쉬어가도 괜찮을 테니.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갔다.
「여름의 맛」
- 발행일 2025년 8월 6일
- 글쓴이 무지
- 작은배가 진행하는 <일상묘사 : 수필 합평 모임>에서 탄생한 글입니다.
- Zine으로 만들어 읽기
PDF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한 후 8페이지 Zine 만드는 법에 따라 자르고 접으면, 글이 담긴 Zine을 만들 수 있습니다. .
· 「백화옥 (1)」, 고구말랭이
· 「첫 담배를 사러 가는 길에」, 금비
· 「여름의 맛」, 무지
· 「숨어있던 철심처럼」, 고은비
· 「보글보글 사이다」, 우수비
· 「둘보」, 윤 재
· 「다른 시간에 살았던 우리가」, 지영
· 「흑백사진」, 페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