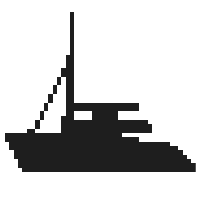「보글보글 사이다」, 우수비

해가 중천에 뜬 주말 오전 10시. 동생이 방문을 활짝 열고, 큰대자로 누워 자고 있었다. 7년 차 대학병원 간호사인 동생은 야간 근무가 잦은데, 그런 날이면 아침해가 뜨고서야 퇴근했다. 다행인 건 타고난 수면 능력 덕분에 주변이 밝고 소란해도 잘 잔다는 점이다.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이것저것 딴짓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잠꼬대로 누군가에게 막 화를 냈다가 이내 잦아들었다. ‘병원에서 어지간히 힘들었나 보네.’ 동생의 방은 거실에서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있다. 바람 빠진 기다란 풍선 인형처럼 침대 위에 축 늘어져 자는 동생을 바라보다가 그녀의 발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종종 동생의 오른쪽 발바닥을 보곤 한다. 더 자세히 말하면 가운뎃발가락에 새살이 돋아 볼록한 흉터를 본다. 나와 다투다가 생긴 흉터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동생은 한 학년 아래였을 때 일이다. 부모님은 모임을 가고 안 계셨고 우리 둘만 집에 남겨졌다. 싸움의 시작은 항상 너무 사소해서 지금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저 그맘때 우리는 다툼의 이유보다 누가 이기고 지냐가 더 중요한 듯 자주 싸웠다. 그날도 엎치락뒤치락 입씨름하다가 잠시 싸움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얄미운 동생이 빨래를 걷으러 베란다로 간 사이 나는 약삭빠르게 베란다의 문을 잠갔다. 무더웠던 여름날, 가뜩이나 더위도 잘 타는 동생은 바짝 열이 올라 곧 터질 듯한 얼굴로 빨리 열라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나는 유유히 모른 척하며 베란다에서 멀어졌다. 이번 판은 나의 승리로 끝나리라 짐작했다. 잠시 후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이 나의 뒤통수를 쳤다. 동생이 베란다 문을 발로 차 깨버렸다. 그것도 이중창인 유리문을……. 동생은 아픔도 느껴지지 않는 듯 분에 차서 씩씩대고 있었다. 바닥에는 금세 피가 고였고 자세히 보니 동생의 가운뎃발가락 살이 찢어져 덜렁거리고 있었다. 처음 겪어보는 유혈사태라서 나는 덜컥 겁이 났고 급히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우리는 아빠 차를 타고 근처 한국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난생처음 가본 응급실의 분위기는 한여름에도 차갑고 서늘했다. 나는 더 두려워졌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좔좔 흘렸다. 내가 문을 잠가서 동생이 다쳤는데 부모님도 동생도 나를 탓하지 않았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더 커졌다. 동생은 상처에 마취 주사를 맞고 열세 바늘이나 꿰매는데도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잔뜩 뿔난 표정은 사라지고 얼굴에 약간의 긴장감과 침착함이 어렸다. 옆에 있던 간호사는 다친 건 동생인데 언니가 더 운다며 나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다. 이번 싸움에 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동생은 나보다 한 수위였다. 통통 튀는 내 동생을 잘못 흔들면 팡 터져버린다는 걸 예상하지 못했다.
동생이 핵사이다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나는 조심했다. 크고 작은 말다툼은 있었어도 동생의 폭발 버튼을 누르는 일은 피했다. 덕분에 피를 보는 일은 더는 없었다. 그렇게 많은 계절을 함께 보냈고, 성인이 된 우리는 N극과 S극처럼 너무 달라서 오히려 철썩 잘 맞는 자매 사이가 되었다. 세상에 온갖 밈이란 밈은 줄줄 꿰고 있는 동생과 아이돌 얼굴도 구분하지 못하는 나, 하고 싶은 말은 꼭 하고야 마는 동생과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 통한다고 생각하는 나, 주인공 체질인 동생과 누군가의 시선만 느껴져도 얼굴이 빨개지는 나. 달라도 너무 달라서 같이 있으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걸 주고받았고, 그럴 때면 우리의 세계가 조금 더 넓어지는 걸 느꼈다.
동생의 카톡 말투가 미묘하게 다운된 날이었다. 청량감 넘치는 동생에게도 세상이 고구마를 먹이는 일이 종종 있다. 30년 가까이 쌓인 서로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목소리, 카톡 말투, 눈빛의 미묘한 변화만으로도 기분을 감지할 수 있다. 둘 중 하나가 좀 우울한 것 같다 싶으면 나머지는 귀신같이 알아채고 ‘일대일 맞춤 케어 서비스’가 들어간다. 이번엔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차례인 듯했다. 나는 동생의 퇴근 시간에 맞춰 우리의 소울푸드 엽기떡볶이를 시켜뒀다. 실속세트에 우동사리와 야채튀김도 추가했다. 통이 큰 동생님은 양이 모자란 식사를 무척이나 싫어하신다. 식탁에 앉아 약간의 허기를 채운 듯한 동생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다. 동생은 물꼬가 터진 듯 병동에서 있었던 일을 쏟아냈다. 무연고자 환자가 병동에 있었는데 사망 직전이 되자 긴급하게 보호자를 찾아야 했다고 한다. 모두가 허둥지둥하는 상황에서 팀장님과 선배 간호사가 동생을 과도하게 몰아세웠고, 결국 보호자를 찾아 마무리는 됐으나 퇴근할 때 팀장님이 동생의 인사를 받지도 않고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것이다. 나름 본인도 7년 차 간호사로서 제 몫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겪는 일 앞에서 느낀 당혹감과 무력감에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다.
나는 유사 사이다라도 되고자 있는 탄산 없는 탄산 다 끌어모아 기포를 뽀글뽀글 내뿜었다.
“듣고 있으니 어이가 없네. 그 사람들 어른 맞음?! 어른이면 후배를 감싸주고 다독여줘야지! 그 팀장 그렇게 안 봤는데 웃기다. 무사히 끝났으면 됐지. 제일 많이 고생한 건 담당 간호사인데 본인이 뭔데 너 인사를 무시해!!! 그리고 창피해하지 마. 당연히 처음 해보는 업무면 좀 버벅댈 수도 있지! 팀장이 너한테 실망하는 표정을 처음 봐서 스스로 너한테 실망했고만. 너는 항상 모든 문제의 원인을 너한테서 찾더라. 그러지 좀 마!”
동생은 평소와 다르게 풀이 죽어 대답했다.
“어······. 내가 좋아했던 팀장님이 나한테 그래 버리니까 더 상처받았나 봐······. 얼굴도 보기 싫어져 버리네. 출근 어떻게 하냐.”
나는 있는 힘껏 한 번 더 내뿜었다.
“야, 욕 싸질러버리고 때려치워! 네가 손해냐, 병원만 손해지 뭐.”
동생은 살다 보면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한 일이 난데없이 생긴다는 걸 알았듯이, 이제는 맘에 안 든다고 매번 유리창을 뻥 깨버릴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말이라도 시원하게 해주고 싶었다. 동생은 기분이 한결 나아져 보였다. 우리는 떡볶이 떡과 함께 누군가를 잘근잘근 씹어댔다가 깔깔깔 웃었다가, 같이 화냈다가, 찔끔 눈물도 흘렸다.
거친 세상이 우리를 억지로 깔 때마다 주거니 받거니 우리는 서로에게 시원한 사이다 샤워 서비스를 한바탕 제공했다. 그러고 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았다.
「보글보글 사이다」
- 발행일 2025년 8월 6일
- 글쓴이 우수비
- 작은배가 진행하는 <일상묘사 : 수필 합평 모임>에서 탄생한 글입니다.
- Zine으로 만들어 읽기
PDF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한 후 8페이지 Zine 만드는 법에 따라 자르고 접으면, 글이 담긴 Zine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백화옥 (1)」, 고구말랭이
· 「첫 담배를 사러 가는 길에」, 금비
· 「여름의 맛」, 무지
· 「숨어있던 철심처럼」, 고은비
· 「보글보글 사이다」, 우수비
· 「둘보」, 윤 재
· 「다른 시간에 살았던 우리가」, 지영
· 「흑백사진」, 페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