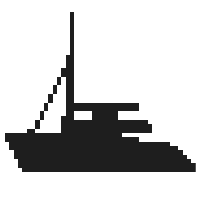정체성 벗어 던지기
마음 가는 대로 창작하며 가능성을 실험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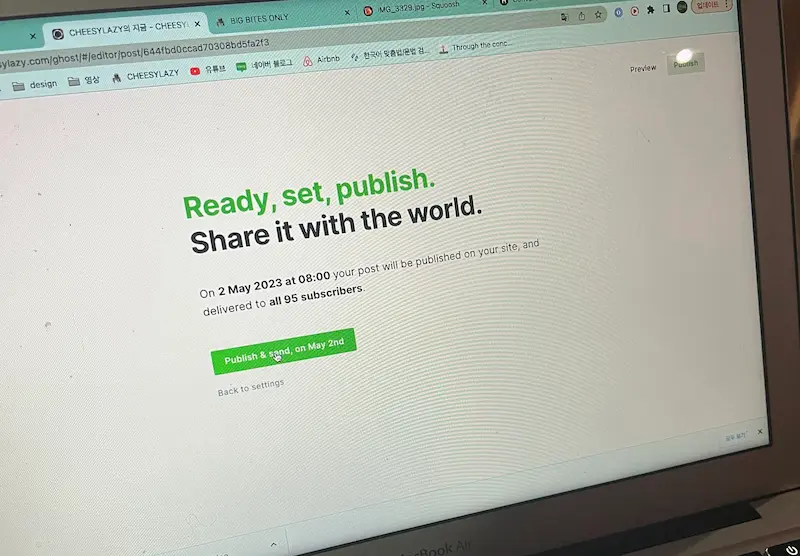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 사장이 되었다. 그런데 가끔은 식당이 나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든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식당 브이로그를 보았다. 구체적인 팁을 얻거나 방법론을 배우고 싶었다기보다는, 사장으로 사는 삶을 미리 곁눈질하고 싶었다. 너무 많은 영상을 내리 보았던지,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폐업 브이로그’의 세계로 나를 안내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식당 브이로그와 폐업 브이로그의 연관성이 웃기고 슬프다)
한 카페의 마지막 영업일이 담긴 영상을 기억한다. 사장님은 ‘카페가 감옥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매일 같은 시간 출근해서 한산한 가게를 지키며 노동했고, 혼자 일하다 보니 대화할 상대도 없었기 때문이다. 큰돈을 투자해 만든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꼴이라니. 열의에 찬 예비 사장이었던 나에게 그의 경험담은 역설처럼 보였고, 개업 1년을 넘긴 지금도 그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한다. 그래도 ‘감옥 같다’는 표현은 내 머릿속 깊이 박혔다.
개인이고 회사고 할 것 없이 ‘브랜드’가 되어 눈에 띄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세상이다. 치지레이지라고 다를 것은 없다. 광고나 홍보는 전혀하지 않아도,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무슨 사진을 걸어둘지, 어떤 문구로 우리를 소개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거창한 슬로건이나 멋들어진 문구는 내 옷같지 않은데.' 결국 가장 명쾌하면서 절대 변하지 않을 한 가지 정체성을 소개 문구에 담았다.
‘안녕하세요, 제주 비건 샌드위치샵 치지레이지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적고 나니 마음이 편안했다. 과장 없이 담백한 느낌이 우리다워서 좋았고, 이해하기 쉬운 ‘브랜드’처럼 보인다는 생각도 들었다. ‘제주’나 ‘비건’처럼 눈에 띄는 단어가 소개에 들어가니 안심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단순하고 명료한 소개가 답답해졌다. 나는 평일에 샌드위치를 만들고 주말에는 글을 쓴다. 독보적인 비건 샌드위치를 만들고 싶으면서도 뛰어난 콘텐츠 제작자가 되고 싶다. 제주의 편안함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단점이 많은 곳이라 생각하고 외국 외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미래를 상상하고는 한다. 자기만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선배 사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
더 멀리, 더 넓게 나아가고 싶어질수록 ‘제주 비건 샌드위치샵’이라는 세 단어는 나의 가능성을 방해하는 감옥이 되었다. ‘식당을 제대로 운영할 시간도 부족한데 글을 쓴다는 게 오만해 보이진 않을까?’ ‘1년 차 식당 사장이 창업을 위한 유료 콘텐츠를 발행하면 우습지 않을까?’ ‘언젠가 제주를 떠나고 싶어지면 어떡하지?’ 나는 ‘제주 비건 샌드위치샵’ 사장보다 더 복잡한 존재인데, 스스로 정한 정체성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제는 ‘제주 비건 샌드위치샵’이라는 정체성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기로 한다. 그 대신 마음 가는 대로 창작하며 가능성을 실험하고 싶다. 식당이라는 정해진 틀을 깨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치지레이지를 응원해 주는 친구, 손님과 함께하고 싶다.
나라는 사람, 치지레이지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인스타그램 프로필 150자에 압축할 수는 없다. 언젠가 치지레이지가 폐업하는 날이 온다고 해도, ‘가게가 감옥 같아서’가 아니라 ‘나를 담기에 가게가 너무 작은 그릇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