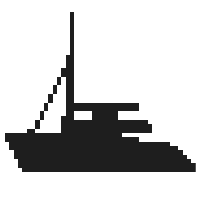글이 안 써질 땐 어떻게 하나요
가볍게 시작하는 것만이 나의 글쓰기를 도왔다.

글이 안 써질 때
글이 도무지 써지지 않을 때, 나는 노트북을 닫고 휴대폰 메모 앱을 연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구잡이로 써내려 간다. 오타나 비문은 신경 쓰지 않는다. 떠오르는 문장을 빠르게 낚아채기 위해 음슴체를 쓰기도 한다. 주제에 대한 생각을 쏟아낸다는 느낌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듯 휴대폰 화면을 두드린다.
얼추 생각을 다 쏟아냈다 싶으면, 다시 읽으면서 오타를 바로 잡거나 문장을 완성한다. 휴대폰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세심한 퇴고는 불가능하다. 문단을 새롭게 나누거나 합치고 문장의 순서를 바꾸기도 하지만, 글을 완성하기 위해 고심하는 대신 눈에 바로 보이는 문제만 고친다.
이쯤 되면 더 쓰거나 고치고 싶은 것이 계속 생긴다. 하지만 휴대폰으로는 딱 여기까지. 미완성의 글을 노트북으로 옮겨 큰 화면으로 마저 쓴다. 오늘 소개하는 방법의 묘미는 바로 이 순간에 있다. 글의 양감을 파악하기 어려운 핸드폰에서는 ‘내가 쓰고 있는 것이 글인가 메모인가 나와의 채팅인가’ 싶겠지만, 큰 화면으로 보는 순간 ‘내가 꽤 긴 글을 쓰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텅 빈 화면을 마주하는 공포
1시간 동안 첫 문장만 썼다 지웠다 반복하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든다. 글을 결국 끝맺지 못할 거라는 생각. 이번 마감은 어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자포자기 심정. 그럴 때 내게 필요한 건 텅 빈 화면을 마주하는 공포를 한 번 물리쳐보자 하는 용기가 아니었다. 그저 더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무대를 옮겨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만이 나의 글쓰기를 도왔다.
큰 모니터로 글을 다시 보면서 그중 절반을 지우고 남은 부분 역시 모두 고쳐야 해도 상관없다. 이미 가장 중요한 단계를 넘었으니까. 바로 ‘시작’ 말이다. 지금껏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그만두었던가. 멋진 글을 쓰겠다는 욕심에 발목 잡혀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메모장에 아무 말이나 끄적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딱 한 발짝씩
출판사 작은배로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지금, 여러 걱정이 머리를 스쳐 간다. 우리가 좋은 책을 만들 수 있을까. 잘 하고 싶은데. 언제쯤 첫 책을 낼 수 있을까. 작은배의 앞날을 고민하다 보면 텅 빈 화면을 마주하는 공포심이 든다. 제대로 된 시작조차 하지 못 한 채 나는 커다란 백지 앞에 너무나도 작아진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저 아주 작은 화면이라는 걸. 마음을 가볍게 먹어야 한다. 짧은 글이나마 계속 쓰고, 크고 작은 모임을 열고, 나 자신을 ‘출판사 사장’으로 소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시작 단계를 넘어서 작은 화면을 검은 글씨가 가득 채우고 내 안에 쌓인 이야기를 이리저리 다듬다 보면, 어느 순간 한 권의 책을 만드는 날도 오지 않을까.